

이름
츠쿠모 하나비
(九十九 華火/つくも はなび/Tsukumo Hanabi)
키/몸무게
173/59.7
나이
19
국적
일본
성격
마른 봄과 다정한 온기.
아이는 어딘가, 봄을 닮았더라. 내뱉는 말은 다정했고, 따뜻하며,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. 말도 참 예쁘게 하고, 스킨십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상대에게 향하는 행동마저 그랬다. 장난 치는 걸 좋아하는 듯 했지만 폭력, 폭언 따위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었다. 항상 달게 애정을 속삭였고 양 입 꼬리가 다 올라갔음에도 약간은 삐뚜름한 표정이지만, 그 미소에 악의가 없다는 것쯤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다. 천생이 상냥한 사람인 듯 했다. 상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는. 하지만 건조하다는 분위기가 들었다. 진심이 아닌 듯 어딘가 매마른 느낌을 숨길 수 없었고 숨길 생각도 없었다. 향기를 잃어 곧 바닥에 떨어질 시든 꽃. 메말라버린 봄.
굳어지지 못한 속내.
쉽게 무너졌다. 애정에 약하고 정에 물러졌다. 단단하게 굳어지지 못 하고 가벼운 충격에도 쉬이 스러지곤 했다. 지탱하지 못한 채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. 하지만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단단함을 만들어 내기 보다 빠른 회복력을 선택했다. 바닥에 주저 앉아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곧게 몸을 일으킨다. 타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에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기 전, 혼자서 자신을 케어했다.
메르헨과 몽상.
사람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가끔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. 고독하게 쓰러졌다 일어나길 반복하던 아이는 꽤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. 피해 주기 싫어서 선택했던 것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었다. 아이는 결국 지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몽상을 꿈꾸기 시작했다. 유독 멍때리는 시간이 많았다. 가만 홀로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상의 원더랜드에서 이상의 꿈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. 그 동화에 대해 얘기하는 아이는 꽤나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냈고 탄탄하게 살을 붙인 동화와도 같았다. 가끔 주고 받는 대화엔 꿈을 꾸는 듯 허상의 말을 내뱉곤 했다.
기타
• 아름다운 불꽃
- 7월 31일 생.
- RH+O
- 어머니, 아버지, 외동 아들.
- 밤산책을 그리도 좋아하더라. 몰래 밤에 나가곤 하다가 혼나는 게 한 두번이 아니라고.
- 검도를 참 잘했다. 대회 같은 곳 가서도 쉽게 우승을 쓸어올 정도.
다른 운동도 꽤 잘 하는 편이었다. 배우면 금방금방 따라하는 걸 보니 타고난 체육인인가봐.
- 공부는 중상위권.
- 단 걸 좋아했다. 초콜렛, 몽블랑, 사탕, 도넛 등등.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갈까?
- 겨울. 겨울을 좋아해.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은 싫어.
- 향에 민감했다. 짙은 냄새 싫어 불쾌한 냄새 싫어. 블랙체리 향이 제일 좋아.
- 여자 이름이라고 놀리지 말고.


"사랑해, 알잖아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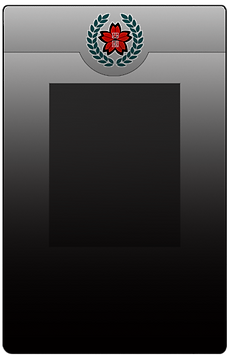
전체적으로 흐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. 밝은 빛의 머리카락은 그 어떤 색도 품지 않은 듯 하더니 자세히 바라보면 푸름을 머금은 옅은 잿빛이었다. 관리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이 얇아 손끝으로 스치면 부드러이 흘러내렸고 목 중앙까지 떨어져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었다. 볼을 스치는 양 옆 머리의 길이가 달랐다. 왼쪽은 턱 아래로 떨어질 만큼 길었으나 반대쪽은 중앙에서 뚝 끊어졌다. 귀가 훤히 들어나는 방향엔 푸른색의 끈과 작은 방울이 엮인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. 고갤 가볍게 흔들 때마다 울리는 맑은 종소리. 아이는 그 소리를 꽤 좋아했다. 한쪽으로 깔끔하게 넘어간 앞머리 아래 평탄하게 이어진 눈매는 퍽 짙었고, 그 사이서 두룩 굴러다니는 눈동자는 물을 닮은 밝은 하늘색. 흐린 것들 사이에서 색이 어찌나 유독시리 선명한지 여름 날 보았던 쨍한 푸른 하늘을 닮은 것 같기도 했다. 피부는 희었고, 꽤나 보드라움을 가지고 있었다. 오뚝하게 자리잡은 코, 그 밑에서 달싹이는 입술은 여릿한 분홍색이 피어있었다. 전체적으로 얇은 뼈대와 길게 뻗은 팔 다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이 빼앗기는 곳은 아이의 손이었는데 가는 철사에 곱게 빚은 반죽 빚어 뭉쳐놓은 듯 단정하고 길죽한 모양새였다. 부스럼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는 손. 검도를 하는 아이의 손이라고 하기엔 작은 흉터나 굳은 살 조차 보이지 않았다. 흐린 분위기, 좋게 말하면 유한 느낌이어서 사람들에게 항상 첫인상을 좋았다. 성격 만큼이나 겉으로 보기에도 다정한 느낌을 자아냈다.
백칠십삼의 키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순 없었다. 평균의 눈높이. 그저 얇은 몸인줄 알았더니 그래도 운동을 꽤 하는 편이라고 구석구석 잔근육이 잡혔다. 그 덕에 보기 싫은 몸매는 아니었나. 셔츠와 흰 무늬가 그려진 회색 맨투맨. 아직 이렇게 입기엔 덥지 않나 싶었는데, 그 위에 유카타까지 걸치고 있었다. 짙은 파란색에 적당하게 무늬가 새겨진. 집에서 자주 입고 있는 것이라고. 발목까지 흐르는 그대로 냅둔 터라 바닥에 자주 끌려 주섬주섬 옷 정리하는 모습을 수시로 보였다. 구김 없이 깔끔하게 발목까지 떨어지는 갈색 바지와 흰 운동화.
















